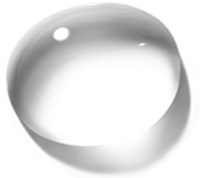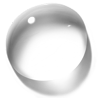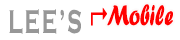어느 영문학 교수의 이야기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에 사는 친구녀석이 이 글을 보니 내가 생각 난다면서 보내준 글인데 나는 그 글을 읽으니 형 생각이 나서 옮깁니다. 오랫만에 들어 오니 어디다 글을 써야 할지 몰라 여기 좁은 공간을 비비고 들어왓읍니다.
그 선생님이 보고 싶다 ***
*********
북의 남침으로 부산, 진해, 마산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공산군의 점령하에 들어가 있을 무렵이다. 당 시 해군사관학교는 전쟁 중에도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써 우리 사관생도들은 낮에는 교육, 훈련을 지속 하면서 저녁에는 진해 군항 방위사명을 띄고 적의 진격을 막는 군사작전에 임하여야 했었다.
*- 최고급 교수진*
우리들은 공부하랴, 훈련하랴, 임전하랴 눈코뜰새 없는 일과를 보내야 했지만 그런 중에도 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권위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이 공산치하에 들어가자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아야 했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교수들도 서울을 빠져나 와 피난민들과 함께 남하하여 부산 등지에서 처참한 피난생활을 겪고 있을 때 해군사관학교의 교수모집광고를 보고 몇 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교수님들이었기 때문이다.
기억나는 대로 몇 분을 거명한다면 물리에 권영대 교수, 박동현 교수, 수학에 김시중 교수, 영 어에 최관석 교수, 이현원 교수, 송욱 교수, 김진만 교수 등 등 최고급 교수들이 그 살벌한 전쟁 중에도 갈급한 우리 사관생도들의 지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었다.
내가 그리는 그 선생님도 그들 중에 한 분이었다. 대위 계급장에 군복은 입었으나 양말 없이 신은 군화에다가 15도 각도로 쓴 군모, 사시절 걷어 올린 소매에 걸음걸이는 마치 철렁거리는 파도 같기도 했다. 그의 몸짓이나 행동은 그야말로 군대생활의 모든 규범으로부터 자유 한 것 이어서 통솔의 책임을 진 상관의 눈에는 거슬렸지만, 24시간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 사관생도에게는 그 선생님은 호연지기와 대범(大泛)의 상징적 존재로 피곤에 찌들고 각박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해주셨다.
*- 감동을 주는 수업*
그는 영어를 철학 강의하듯이 가르쳤다. 철학에 심취해서 외국어 서적을 모조리 찾아 읽다 보니 어느덧 영어를 마스터하게 됐다는 그의 말대로 그에게 있어서 영어는 어디까지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님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영어교관과 크게 다른 점이었고 그래서 그의 수업시간은 적어도 내게만은 꿈을 꾸듯 즐거웠다.
그가 나의 영어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EQ 함양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은 그의 가르침이 단지 언어학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영어를 ‘철학적’으로 때로는 ‘미학적’으로 가르치는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웬만한 영어학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하고 웃어 넘겨버리겠지만 나는 여기에 완전히 황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영어단어 하나하나의 완벽한 발음을 고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흐름 즉 ‘Diction’과 ‘Intonation’을 바로 하는 것을 가르쳤고 문장 또는 표현의 혼(魂)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곤 했다. 그러니까 그는 언어학자 라기보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 될 것 같다. 늘 언어의 진수(眞髓)를 말했고, 말의 양보다 질을 강조했고, 단어의 무작위적인 배합은 생명이 없는 표현이라 가르쳤다. 언어도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배워야 한다면서 감동을 주는 표현들을 많이 익힐 것을 권하기도 했다. 언젠가는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공중 나는 새를 보라…”를 “Look at the birds in the sky…” 라고 하기보다는 “Behold the fowls in the air…”라고 한 것이 얼마나 더 영감적인 표현이 되는 줄 아는가 하고…우리에게 되묻는 그의 상기된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떤 때는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우리 생도들의 의례적인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흑판을 향해 그저 서있다. 모두 궁금해서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저렇게 서계시기만 할까…하고 있는데 얼마 후 우리를 향한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John Milton의 ‘실락원(Paradise Lost)’ 을 읽다가 너무 감동되어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교실로 들어오는 길이라면서 감동 받은 몇 구절을 무대에 선 연극인처럼 읊은 후 다시 그의 영감의 세계로 되돌아가 한참 동안 서성이시다가 약 1,2분 후에 야 현실로 돌아와 예정된 수업을 계속하곤 하였다. 결코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 교관의 이러한 분위기가 전화(戰禍)속에 시달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흡족한 정서와 생명력이 되었는지 모른다.
*- 20년 만에 만난 선생님*
전쟁이 끝나고 나는 장교가 되어 장기간의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군에서 제대를 하고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외에 나가있을 때나 국내에 있을 때나 하루도 그 영어 선생님을 잊어본 일이 없었다. 어디서 무얼하고 계실까…늘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알 길이 없었다.
'1968년경이었던가…회사 직원들과 함께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앞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이발 안 한지가 1년은 더 된 것 같은 긴 머리에 거구의 남자가 머리를 숙인 채 걸어오는데 그의 걸음거리가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걸음걸이 같아서 혹시나 하고 가까이 가서 “혹시 ○○○선생님 아니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대답은 않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저에요, 차윤 생도, 아시지요?” 했더니 “오오-그 차윤…알고말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행인들로 꽉 찬 길 한복판에서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서있었다. 나도 울고 선생님도 울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바빴다. 식사도 같이하고,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해야 했다. 물 론 기성복 집에 가서 사이즈가 큰 양복한벌도 새로 사 입혀드렸다. 그리고 극구 사양하는 선생님의 고집을 꺾고 살고 계신다는 곳을 찾아갔다. 남산 입구에 자리한 판자집이었다. 마침 사모님은 출타중인 듯 안 계시고 겨우 비집고 들어간 방은 세평도 안되 보이는데 벽에, 방바닥에, 작은 탁자 위에 밑에 책들로 빼곡히 차있을 뿐 한 사람 누울 자리도 없는 게 아닌가.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질 않았다. (중략)
내 회사에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선생님을 고문으로 모셨다. 회사 직종이 영어와 관련이 많았던 고로 그 동안 사장인 내가 직접 해온 영어관계 업무를 모두 선생님께 떠 넘기고 섭섭지 않을 정도의 월급을 드렸다. 선생 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 후 약 2년간 나는 선생님을 매일 보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웬만한 데는 늘 같이 다녔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즐거웠던 것은 점심식사 후에 명동 뒷골목에 즐비하게 늘어져있는 고서(古書)책방에 들려서 웬만한 사람 눈엔 잘 띄지도 않는 값진 고서를 찾아내어 연극을 부리면서 싼 가격에 매수하고서는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기쁨이었다. 당 시만 해도 고서에 관한 한 선생님의 손을 거쳐가지 않은 책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는 다독가 이면서 한편 그의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연애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보다 못하지 않는 것이었다.
*- 그의 유별난 책 사랑*
선생님의 책을 다루는 모습은 참으로 특별하다. 금 방 출산한 애기를 다루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먼저 책 커버를 어루만지고 음미한 다음, 조 심스럽게 페이지를 연다, 어떤 때는 그 손이 떨리는 것을 본다. 주로 헌책을 만지다 보니 더 상할까 봐 조심하는 거겠지…했는데 몇 년 같이 다니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뭐라고 할까… ‘새로운 세계에 겸손히 첫 발걸음을 내딛는 방문자의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알맞은 표현일 것 같다. 모든 책은 입수하자마자 일단 새 옷으로 갈아 입힌다. 책 커버나 바인딩이 상해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그 정성 또한 놀랍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선생님의 표정이다. 책을 가지고 있을 때의 표정과 빈손으로 있을 때의 표정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행복에 겨운 밝은 얼굴과 허탈하고 성낸 것 같은 초조한 표정만큼의 차이니까 말이다. 선생님과 책 헌팅이나 하고 다니고 밤낮으로 철학, 문학, 시, 종교, 정 치, 예술, 음악의 세계를 만유 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선생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심취하다 보니 장사가 될 리가 없었다. 3년 이 되던 해 마침 정부의 모 부처에서 이사관(理事官)자리를 줄 테니까 와서 일해달라고 해서 마음을 정하고 회사 문을 닫았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됐다.
이때에 도움이 왔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귀에 담아둔 친구가 내 사정을 알고 나서 자기 회사에서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선생님의 양해를 얻어 그 큰 회사에서 내가 드린 월급의 두 배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서 약 5년간 근무하시 다가 70가까이 돼서 은퇴하셨다.
직장을 옮긴 후에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됐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친교를 부러워했다. 그러던 중 나는 다시 해외근무를 해야 했고 어느 시점부터 선생님과의 연락이 두절됐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이 1987년경이었으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셈이다. 살아계시다면 지금 92,3세쯤 되셨을 텐데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다. 제발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그 옛날 나누었던 그 이야기, 그 책, 그 감동 다시 되살리면서 남은 생을 살고 싶다.
- 이전글
 윌리엄 워즈워드의 세계 (영국 기행 중 일부) 08.08.12
윌리엄 워즈워드의 세계 (영국 기행 중 일부) 08.08.12 - 다음글 日 記 4월 x일 06.09.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