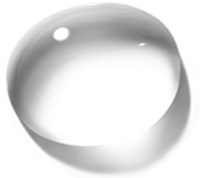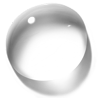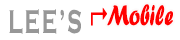비잔티움으로의 비행
페이지 정보
본문


퇴임한지도 어느덧 십년이 가까워 오는 전직 영문학 교수인 나는 지금도 자주 과거에 내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영시들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모두가 하나같이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들 가운데는 나의 영어실력이나 심미적 감상능력, 또는 인생경험 등이 부족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해하고 감상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도 적지 않다.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 불가능 하다. 나는 이런 어려운 시를 가르치겠다고 학생들 앞에서 쩔쩔매던 때를 생각하고는 혼자 계면쩍은 웃음을 짓기도 한다. 이제 와서 부담 없이 다시 읽어보아도 애매하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나는 이런 시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다. 나도 모르게 유감과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다 지나갔다. 내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의 이해와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어려운 시가 신기하게도 이제 와서 뒤늦게나마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나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이런 작품에 접할 때마다 나는 즉시 나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실로 달려가 이번에는 좀 더 자신 있게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이 시를 다시 한 번 가르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곧 현실로 돌아온다. 모두가 부질없는 일. 나는 이미 물러난 사람. 이제 나를 기다리는 교실도, 학생도 없다.
영국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William Butler Yeats, 1865-1939)의 “Sailing to Byzantium"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라는 시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 번 가르치고 싶은 바로 그런 시 가운데 하나다. 네 개의 스탠자(연, 聯)로 이루어진 별로 길지도 않은 이 시는 시인이 61세에 쓴 것으로 되어있다. 평소 예이츠의 시를 좋아했던 나는 학부 학생들에게는 시인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쓴 이해하기에 비교적으로 쉬운 "The Lake Isle of Innisfree" (이니스프리 호수 섬)을 가르쳤고, 이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라는 비교적 어려운 시는 대학원 학생들에게만 서너 차례 가르친 것으로 기억한다.
그가 쓴 대부분의 후기 시들이 그렇듯이 이 시도 결코 이해나 설명이 용이한 시는 아니었다. 시의 제목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로부터 시작해서, 시인이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럴듯하게 들리고 막연하게 그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분명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은 한마디로 어려운 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가 좋았다. 특히, 제목에 쓰인 “비잔티움”이라는 단어의 뜻과 소리가 좋았다. 그 속에 무엇인가 오래된 것이, 화려한 것이, 번쩍이는 것이, 신비스런 것이 들어 있어 보였다.
지난 시월 어느 날, 밤, 12시, 나는 관광객들을 가득 싣고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이스탄불로 날아가고 있는 터키항공사 소속 보잉 747 제트 비행기의 어둠 속에서 억지로 눈을 감고 지루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때 문득 예이츠의 이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라는 시의 제목이 떠올랐다. 알고 보니 바로 내가 지금 “비잔티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이스탄불이 한때는 비잔티움이었지. 이젠 세월이 변했다. 예이츠야 배를 타고 갔겠지만 나는 지금 비행기로 가고 있다. 집에 돌아가면 <비잔티움으로의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편 써야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자 나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에서 기억나는 구절을 혼자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 보았다 :
An aged man is but a paltry thing,
A tattered coat upon a stick,
(노인이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존재,
지팡이에 의지한 다 해진 저고리)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부리나케 서가에서 내가 재직 시 교과서로 사용하였던 영문학 작품의 집대성인『노턴 앤솔로지』(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를 꺼내어 무엇에 쫓기듯이 페이지를 넘겼다. 예이츠의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를 찾기 위함이었다. 물론 거기에 있었다. 작품의 여기저기에 붉은 연필로 의문 나는 곳을 표시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이 시를 아주 천천히 소리 내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왼 일이란 말인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어려운 시가 아니었다. 같은 시가 너무나 쉽게, 분명하게,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가? 이 시의 제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를 감싸고 있었던 애매하고 모호했던 부분들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 앞에 아침 안개 걷히듯이 말끔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처음 얼마동안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 자신이 믿을 수가 없었다. 기적이 따로 없었다.
나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멍하니 책상에 앉아서 이 신기한 변화에 대하여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시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어렵고 애매하기만 하였던 시가, 이처럼 쉽고 분명하여진 이유에 대하여 나는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이제 막 끝내고 돌아온 터키여행과 연관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쉽게 지적해 낼 수가 없었다.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서히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이스탄불 시내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비잔티움 건축물의 최고 걸작품 하지아 소피아 성당. 바로 이것이었다. 이 “성스러운 지혜”라는 의미를 가진 성당의 위용 앞에서 크고 작은 다른 유명하다는 역사적 또는 종교적 기념물들은 모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그렇다. 구체적으로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어려움과 애매함을 밝혀주는 열쇠는 바로 이 하지아 소피아 (Hagia Sophia) 대성당 내부의 벽에, 천정에, 복도에, 마루에, 채색 유리창에 추상적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그려진 모자이크와 아라베스크 문양 속에 숨어 있었다. 이것들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기까지 나는 예이츠가 그의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잔티움에 있다는 황제의 궁전도,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나무도, 이 황금의 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노래 부르고 있다는 사람이 만든 인공 새들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지 몰랐었다.
시인 예이츠에게 있어서 “비잔티움”은 하나의 이상향이었다. 그가 그곳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성스러운 것, 지혜로운 것, 영구한 것,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도 이제 늙었다. 이제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한때 위안을 주었던 사랑도 아니고, “이니스프리”의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도 아니다. 이 시에서 그는 “비잔티움”으로 상징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성스러운 도시”를 찾아 상호 배격하고, 충돌 대립 하고 있는 자신의 세계를 서로 연결하고 동시에 화합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자, 이제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이야기는 그만 하기로 한다. 비잔티움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그 자리에 콘스탄티노플이 왔다가 또 없어졌다. 이제 그 자리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서 있을 뿐이다. 시인이 찾고자했던 영원하고 영구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는 지금 한 나그네의 눈에 비친 터키의 고도 이스탄불을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다. 내가 본 이스탄불은 서울이나 다름없이 자동차로 가득 찬 복잡하고 혼란스런 전형적인 현대도시였다. 그러나 역시 서울이나 동경, 또는 뉴욕이나 런던과는 전혀 다른 생소함도 있었다. 어렸을 때 읽은 동화나 그림에서만 본 원형 돔 지붕의 회교사원들, 그 옆에 하늘을 뚫고 뾰족하게 높이 솟은 첨탑들, 이곳으로부터 일정시간 마다 울려 퍼지는 장엄한 기도소리,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끝도 없이 경배를 올리는 회교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다.
말로만 듣고 지도에서만 알고 있던 보스포러스 해협, 이 해협 위에 그림처럼 이름답게 놓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다는 보스포러스 대교, 그 밑을 통과는 수많은 선박들; 그 붐비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다리위에서 낚싯줄을 드리우고 고기를 잡고 있는 한가한 사람들, 길거리 어디에서나 가리지 않고 모여앉아 한담을 하던 노인들, 낯익은 군밤장수들의 모습, 구수한 군밤 냄새, 애절하게 한 푼을 구걸하는 걸인들. 마라마라 해변을 따라 죽 늘어서 있던 크고 작은 까페들 - 엄지 손가락만한 작은 잔에 담아내어오는 진한 검은색의 터키 커피의 맛. 무엇보다 그 커피 다시 한 번 맛보고 싶다. 이제 시는 그만 읽으련다. 시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의 것이다.
(2012년 11월)
- 다음글삼성 대 애플 12.10.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